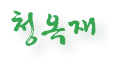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
|
|

 | |
| |
|
 |
|
| 이소 / 굴원 |
|
| |
|
|
|
| [1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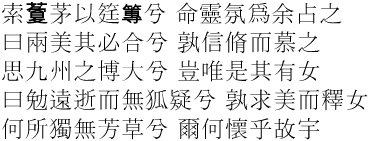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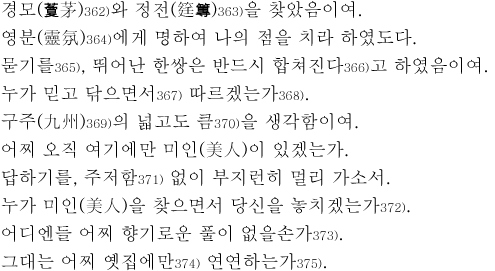 | |
|
| |
|
362) 경모풀. 점을 치는데 사용되었던 풀의 이름. 시초(蓍草)와는 다른 것이다. ?은 다른 말로는 복(?)이라고도 하는데, 복(?)은 꽃빛이 흰색이고, 경(?)은 붉은색이다. 능초(菱苕)라고도 한다.
363) 잘게 자른 대나무 조각. 이것으로써 점을 쳤다고 한다.
364) 고대의 점장이, 술사(術士)의 역할을 하였던 신무(神巫)를 가리키는 말.
365) 曰. 본래의 뜻은 ‘이르다, 말하다’의 뜻인데, 본문에서는 작자와 점장이의 대화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曰 역시 마찬가지로 ‘답하다’의 뜻을 가진다.
366) 兩美必合. 兩美는 ‘두 가지의 아름다움’, 즉 사람에게 있어서는 ‘뛰어난 한 쌍’. 必合은 반드시 합쳐진다는 말이다.
367) 信脩. 脩는 곧 修이다. 修에는 ‘닦는다’라는 뜻 이외에, ‘행하다’의 뜻도 있다.
368) 慕. 본래 ‘그리다, 사모하다’의 뜻인데, ‘믿고 따른다’는 뜻도 있다.
369) 양자강 이북과 황하유역의 땅을 통털어 일컫는 말. 치수(治水)의 공으로써 순(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우(禹)임금이 천하를 아홉개의 주(州)로 나누고, 이를 구주(九州)라고 불렀다고 한다. 구주(九州)는 곧 기주(冀州), 연주(?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형주(荊州), 양주(揚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옹주(雍州)의 아홉 주(州)를 말한다.
370) 博大. 博은 넓다는 뜻이고 大는 크다는 뜻이다.
371) 狐疑. 상게주 참조.
372) 釋女. 釋에는 ‘내버리다’의 뜻이 있다. 女에는 ‘너’의 뜻이 있다. 곧 여(汝)와 통한다.
373) 獨無. 獨에는 ‘어찌’라는 뜻이 있다.
374) 故宇. 故는 ‘옛날’을 뜻한다. 宇은 당우(堂宇), 곧 ‘지붕이 있는 집’을 가리킨다.
375) 懷. 懷는 ‘생각을 품고있다’는 뜻이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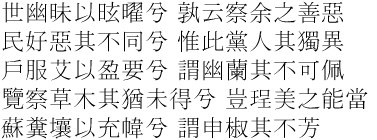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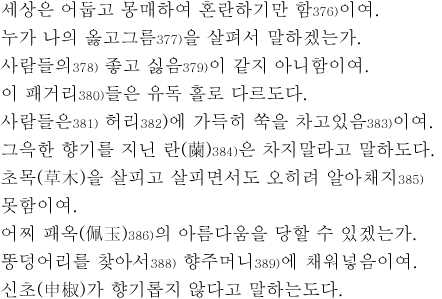 | |
|
| |
|
376) ?曜. ?曜은 당혹해 하는 것. 문선의 주에도 ‘眩曜 惑亂貌’라고 되어있다.
377) 善惡. ‘좋은 것과 나쁜 것’.
378) 民. ‘백성’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본문에서의 ‘사람’은 작자를 비난하거나 작자가 비난하려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379) 好惡. ‘좋아함과 미워함’. 惡는 ‘미워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380) 黨人. 무리에 속한 사람. 본문에서의 黨은 붕당(朋黨), 즉 부정적인 ‘패거리 무리’의 뜻으로 쓰였다.
381) 戶. 전구(前句)의 民에 대응하는 말이다. ‘집’이나 ‘문’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382) 要. ‘허리’의 뜻으로 쓰였다. 요(腰)와 통한다.
383) 服. 服에는 ‘입다’ 이외에 ‘차다, 매달다’의 뜻도 있다. 후구(後句)의 佩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이다.
384) 幽蘭. 향기로운 난(蘭). 또는 한란(寒蘭).
385) 得. 得은 본래 ‘얻다’라는 뜻인데, ‘깨닫다’, ‘알다’라는 뜻도 있다.
386) ?. 허리에 차는 옥(玉)으로 된 장식을 가리킨다.
387) 糞壤. 糞는 ‘똥’, 壤은 ‘흙덩이’를 가리킨다. 또는 壤의 ‘땅’이라는 뜻을 채용하여 ‘똥을 버리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향낭(香囊), 즉 ‘향주머니에 넣는 것‘이므로 ’똥덩어리‘가 적절한 것이다.
388) ?.
389) ?. 침소에 치는 둘러치는 휘장(揮帳). 또는 향낭(香囊), 즉 향을 넣어 허리에 차는 장식용의 작은 주머니.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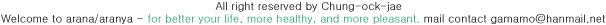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