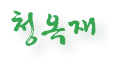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

 | |
| |
|
 |
|
| 추구 / 작자미상 |
|
| |
|
|
|
| [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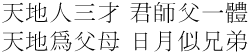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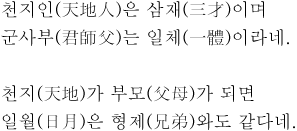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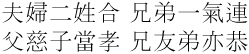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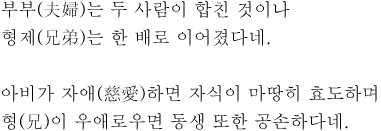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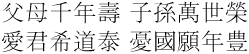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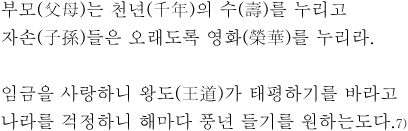 | |
|
| |
|
| 7) 주자(朱子)가 도부(桃符)에 쓴 글이다. 도부(桃符)는 입춘첩(立春帖)이나 춘련(春聯)과 유사한 것으로 중원지방(中原地方)에서 정월(正月) 원단(元旦)에 복숭아나무롤 깎은 작은 나무 패(牌) 한 쌍에 신도(神?), 울루(鬱壘)의 두글자를 쓰거나 사언(四言)이나 오언(五言), 칠언(七言)의 대구(對句)를 써서 대문에 걸어놓아 사귀(邪鬼)를 방비하던 주(周)의 풍습을 말한다. 신도(神?)와 울루(鬱壘)는 문신(門神)으로 추앙되는데, 본래는 동해(東海)의 도삭산(渡朔山)에서 귀신을 검열하는 신(神)이다. 논형(論衡)에 의하면, ‘아주 옛날 사람으로 신도(神?)와 울루(鬱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형제로서 본래 능히 귀신을 잡을 수 있었다. 동해(東海)의 도삭산(度朔山) 위에 살면서 복숭아 나무 아래에 서서 온갖 귀신들을 검열한다. 귀신들이 무도하여 망령되이 사람에게 화액을 입히게 되면 신도와 울루가 갈대 밧줄로 묶어서 호랑이 먹이로 주었다.[上古之人 有神?鬱壘者 昆弟二人 性能執鬼 居東海度朔山上 立桃樹下 簡閱百鬼 鬼無道理 妄爲人禍 ?與鬱壘縛以盧(蘆)索 執以食虎 (王充 論衡 亂龍第四十七)].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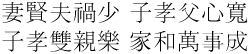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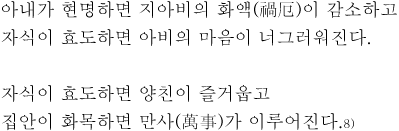 | |
|
| |
|
| 8) 고려(高麗) 추적(秋?)의 명심보감(明心寶鑑) 치가편(治家篇)에 나오는 말이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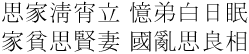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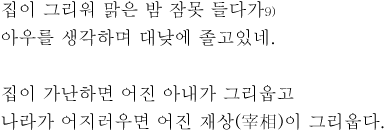 | |
|
| |
|
| 9) 원문은 淸宵立. 淸宵는 맑은 밤하늘. 立은 밤에 서있는 것이니 ‘잠못들어 서성거리는 것’.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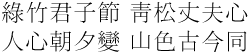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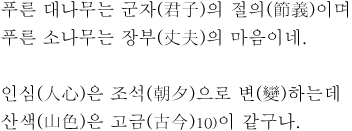 | |
|
| |
|
| 10) 옛날과 지금.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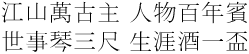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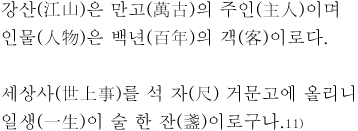 | |
|
| |
|
11) 전만령(全萬齡)의 싯귀 전반부(前半部).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세상사를 석 자 거문고에 올리니/ 일생이 술 한잔이로구나/ 서쪽 정자의 강물 위로 달이 뜨고/ 동쪽 누각의 눈밭에서는 매화가 피어난다네.[世事琴三尺 生涯酒一杯 西亭江上月 東閣雪中梅]’
전만령(全萬齡)은 조선(朝鮮) 성종조(成宗朝) 김천(金泉)의 은사(隱士).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김천에 은거하였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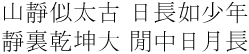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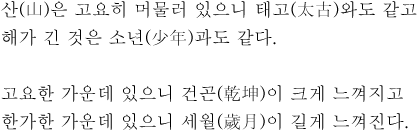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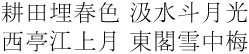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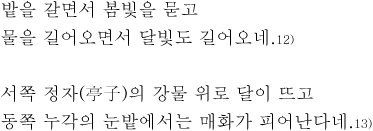 | |
|
| |
|
12)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백련초해(百聯抄解) 가운데 나오는 칠언시(七言詩)이다.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耕田野?埋春色/ 聲痛杜鵑啼落月/ 汲水山僧斗月光/ 態娟籬菊慰殘秋
13) 전만령(全萬齡)의 싯귀 후반부(後半部). 상게주 참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