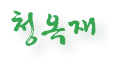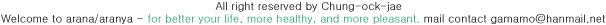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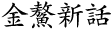

| |
| |
|
 |
|
| 금오신화(金鰲新話) /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 김시습(金時習) [2]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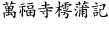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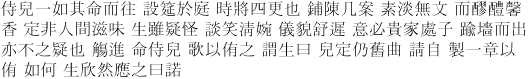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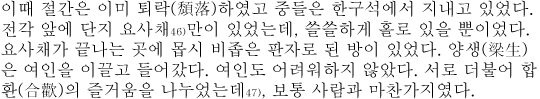 | |
|
| |
|
46) 廊廡는 전각(殿閣) 앞에 가로로 길게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데, 여염(閭閻)의 행랑(行廊)이나 불사(佛事)의 계단(戒壇)과도 같다. 사찰(寺刹)의 공간이므로 편의상 중들이 머물거나 공양객을 머무르게 하는 요사채로 표기하였다.
47) 相與講歡는 곧 합환(合歡)의 즐거움을 나누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講는 ‘얽고 얽힌다’의 뜻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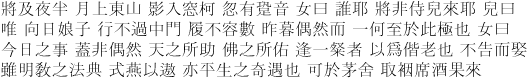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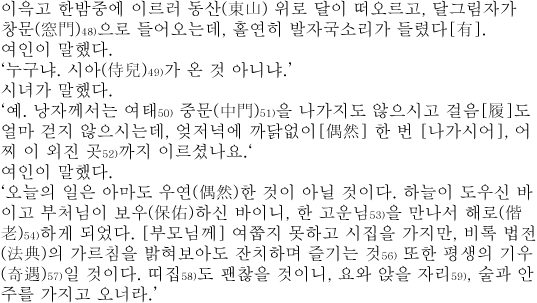 | |
|
| |
|
48) 窓柯. 알 수 없다. 아마도 바라지창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창문을 지탱하는 나뭇자루를 말하는 듯.
49) 시녀(侍女). 부인(婦人)의 시중을 드는 어린 계집종을 말한다.
50) 向日. 본래의 뜻은 지난 번.
51) 격식이 있는 여염의 집에서 대문(大門)과 안채 사이에 따로 설치한 문. 외간남자들은 이 문을 출입하지 못하였다.
52) 極.
53) 粲者. 여인(女人)을 가리키는 말. 본래는 남편이 그 아내를 일컫는 말. 본문에서는 남자를 가리켜 ‘粲者’라고 했으므로 ‘고운님’ 정도의 표기가 타당할 듯 하다.
54) 偕老. 백년해로(百年偕老). 백년동안 같이 늙어간다는 말. 즉 부부가 함께 종신(終身)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시경(詩經) 패풍편(邶風篇)의 격고(擊鼓) 제4구에 해로(偕老)라는 말이 나온다. 死生契闊 與子成說 執子之手 與子偕老/ 于嗟闊兮 不我活兮 于嗟洵兮 不我信兮. (죽거나 살거나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그대와 함께 하자고 약속했네/ 그대의 손을 잡고서 그대와 함께 늙자고 말일세/ 아아, 헤어져 있어 우리 함께 살지 못하네/ 아아,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약속을 이룰 수 없구나.)
55) 娶. 본래는 남자가 장가들거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여자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시집가는 것’이라 함이 옳을 듯 하다.
56) 式燕以遨. 잔치하며 즐기는 것. 시경(詩經) 소아(小雅) 녹명(鹿鳴) 편(篇) 제2구에 式燕以遨라는 말이 있다. 呦呦鹿鳴 食野之蒿 我有嘉賓 德音孔昭 視民不恌 君子是則是傚 我有旨酒 嘉賓式燕以敖. (기쁜 소리로 사슴이 소리내며 들판의 다북쑥을 먹는다/ 내 반가운 손님 있어 좋은 말씀 너무나 밝아서/ 백성에게 후박한 마음 보여주신다/ 군자들도 옳아서 본받는다/ 내 맛있는 술 있어 반가운 손님이 잔치하며 즐긴다).
57) 기이한 만남. 또는 기이한 인연.
58) 茅舍. 띠풀을 엮어서 지은 집.
59) 裀席. 인(裀)과 석(席). 인(裀)은 이부자리에서 바닥에 덧대어 까는 것. 요. 석(席)은 돗자리 등의 맨바닥에 까는 것.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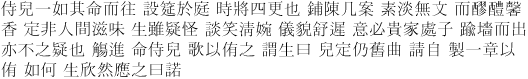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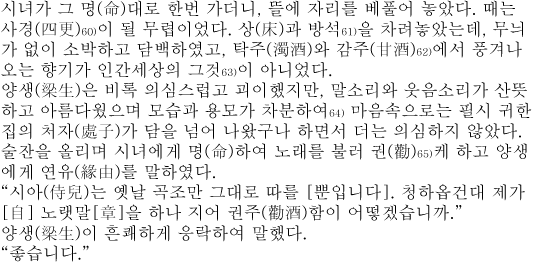 | |
|
| |
|
60) 축시(丑時)무렵. 새벽 2~3시경.
61) 几案.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첫번째는 제사(祭祀)를 올릴 때에 쓰이는 다리가 달린 넓직한 상(床)을 말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의자(倚子), 안석(案席)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62) 醪醴. 탁주(濁酒)와 첨주(甛酒). 탁주(濁酒)는 곧 막걸리이고, 첨주는 곧 감주(甘酒), 즉 단술이다.
63) 滋味. 본래는 좋은 맛의 뜻이다.
64) 舒遲. 본래는 ‘(몸가짐이나 표정을) 활짝 펴고 느긋하게 한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경신편에 나오는 말이다. 禮記曰 君子之容 舒遲 見所尊者 齊遫. (예기에 말하기를 군자의 얼굴은 펴고 느긋하나 높은 바의 사람을 볼때는 두려운 듯 명을 받는듯 한다).
65) 侑는 본래 술을 권한다는 뜻이니, 노래불러 술을 권한다는 것은 권주가(勸酒歌) 또는 권주(勸酒)의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일 것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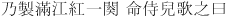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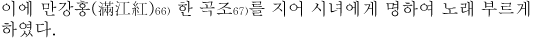 | |
|
| |
|
66) 송(宋)의 명장(名將) 악비(岳飛)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우국충절(憂國忠節)의 노래. 여기서는 만강홍(滿江紅)의 곡조에 의탁하여 새로운 가사(歌辭)를 지었다는 뜻.
67) 일결(一闋)은 한 곡조를 마치는 것. 즉, 한 곡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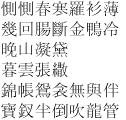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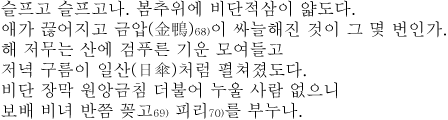 | |
|
| |
|
68) 향로(香爐)의 한 가지. 오리모양의 금빛 향로.
69) 半倒. 비녀가 반쯤 빠져나왔다는 것이니, 곧 머리를 반쯤 풀어헤쳤다는 뜻이다.
70) 龍管. 관악(管樂)에 쓰이는 피리의 한 가지.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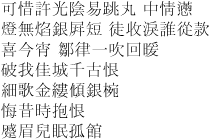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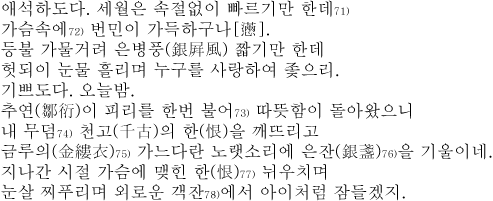 | |
|
| |
|
71) 許光陰易跳丸. 광음(光陰)은 세월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고 도환(跳丸)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 허(許)와 이(易)는 모두 속절없이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72) 中情.
73) 鄒律. 봄날의 따뜻한 기운. 또는 이를 연상케 하는 따뜻한 분위기의 곡조. 난율(暖律). 열자(列子) 탕문편에, 연(燕)나라에 한곡(寒谷)이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날이 추워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므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서 따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74) 佳城. 무덤을 아름답게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흉중(胸中), 즉 ‘가슴속’이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75) 金縷. 금루의(金縷衣)를 말한다. 금루의는 당나라 때에 기생의 신분으로 왕비까지 올랐다가 폐서인으로 강등되어 죽음을 맞이한 두추랑(杜秋娘)이 지었다는 가곡의 이름. ‘勸君莫惜金縷衣/ 勸君惜取少年時/ 花開堪折直須折/ 莫待無花空折枝 (그대에게 권하오니 비단옷을 애석해 하지마오/ 그대에게 권하노니 소년의 시절을 아끼시오/ 꽃이 피어 꺾으려거든 곧바로 꺾으시오/ 꽃지어 빈가지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76) 銀椀. 은으로 만든 주발. 여기서는 은으로 된 술잔.
77) 抱恨.
78) 孤館. 외로운 객잔. 곧 타향에 있는 여관(旅館)을 말한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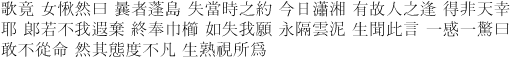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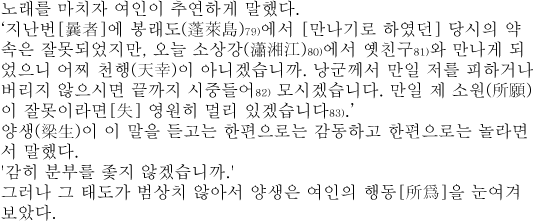 | |
|
| |
|
79) 蓬島. 즉 봉래도를 가리킨다. 이 섬에 봉래산(蓬萊山)이 있는데, 영주산(瀛洲山), 방장산(方丈山)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이 된다.
80) 소강(瀟江)과 상강(湘江). 둘다 강남(江南)의 동정호(洞庭湖)로 흘러드는 물줄기. 아울러 소상강이라고 하는데, 이곳 강가의 풍경이 몹시 아름다우며, 그 가운데 특히 아름다운 여덟가지의 풍경을 소상팔경이라고 한다.
81) 故人. 오래도록 사귄 친구.
82) 巾櫛. 두건과 빗. 즉 머리를 감고 빗는 일. 주로 이러한 일을 시중드는 처첩(妻妾) 등의 여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83) 雲泥는 하늘과 땅. 즉 간격(間隔)이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을 뜻한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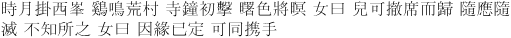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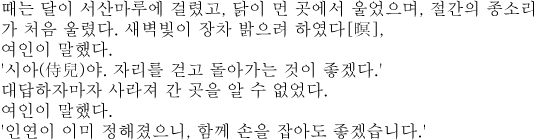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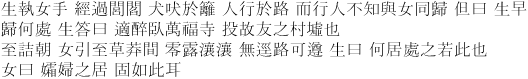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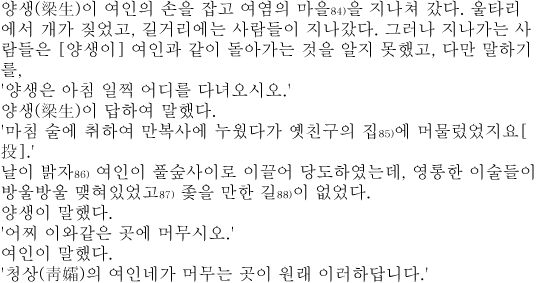 | |
|
| |
|
84) 閭閻. 보통사람들이 사는 마을. 백성들이 사는 마을.
85) 村墟. 시골의 마을을 가리키는 말. 촌락(村落).
86) 至詰朝. 힐조(詰朝)는 본래 ‘다음날 아침‘, ’이튿날 아침‘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날이 밝았으므로 ’다음날 아침‘이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87) 零露瀼瀼. 零露은 방울방울 맺혀있는 이슬. 瀼瀼은 이슬이 많이 내린 모양을 가리키는 말.
88) 逕路可遵. 逕路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또는 이곳 출발지에서 저곳 목적지까지 가는 길.
| |
|
| |
|
|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1 l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