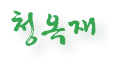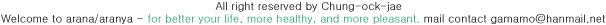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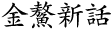

| |
| |
|
 |
|
| 금오신화(金鰲新話) /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 김시습(金時習) [2]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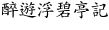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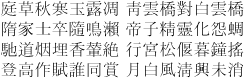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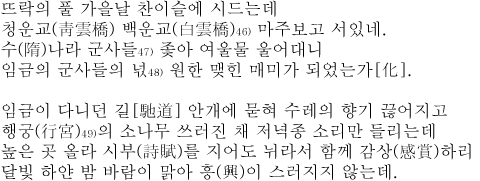 | |
|
| |
|
46) 부벽루(浮碧樓) 남쪽의 돌계단. 곧 위에 나온 ‘청운제(靑雲梯)’와 ‘백운제(白雲梯)’를 말하는 것이다.
47) 隋家士卒. 隋家는 수(隋)나라를 말하고, 士卒은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동원한 백만대군을 말한다.
48) 帝子精靈. 帝子는 본래 ‘임금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수양제(隋煬帝)의 군사들’이라는 뜻으로 쓰인 듯 하다. 수양제가 직접 이끌었던 백만대군이 요동성에 막혀서 더이상 진군하지 못하자, 수군장수 내호아가 10만의 병력으로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성을 공격하였지만, 영양왕의 실제(實弟) 고건무의 용전으로 절반이상의 병력이 궤멸된 채 후퇴하고 말았다. 본문의 ‘帝子精靈.’과 앞에 나온 ‘隋家士卒’은 고건무의 평양성 대첩(大捷)과 을지문덕의 살수대첩(薩水大捷)에서 숨진 수십만의 수나라 군사들의 넋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이다.
49) 임금이 행차할 때에 임시로 묵어가는 궁궐(宮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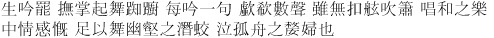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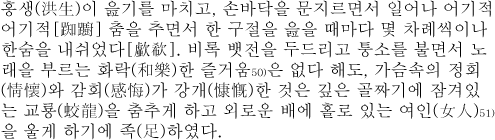 | |
|
| |
|
50) 扣舷吹簫 唱和之樂. ‘뱃전을 두드리고 퉁소를 분다’의 뜻으로,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에 나오는 표현이다. ‘飮酒樂甚 扣舷而歌之(주흥이 매우 도도하게 되어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客有吹洞簫者 倚歌而和之(객 가운데 퉁소를 부는 사람이 있어 노래에 맞추어 화답하였다)’.
51) 백거이(白居易)의 비파행(琵琶行)에서 배 위에서 홀로 비파(枇杷)를 뜯던 여인을 가리킨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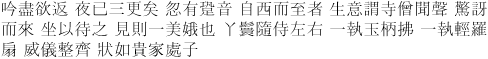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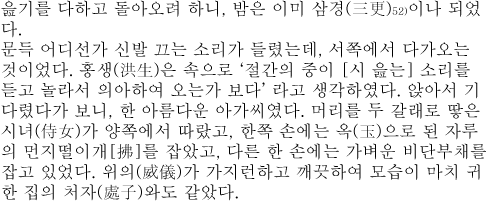 | |
|
| |
|
52) 밤 12시 전후.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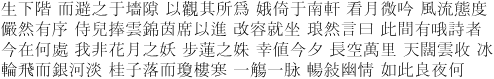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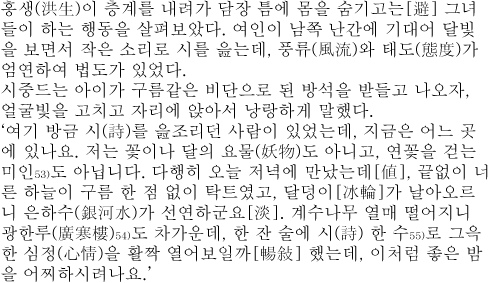 | |
|
| |
|
53) 步蓮之姝. ‘사뿐사뿐 걷는 미인’의 뜻. 步蓮은 ‘연꽃을 걷는다’는 뜻인데, 남제(南齊)의 폐제(廢帝)인 동혼후(東昏侯)가 그 총희(寵姬) 번비(藩妃)로 하여금 금으로 만든 연꽃을 깔아놓고 그 위를 걷게 하면서 "此步 步生蓮華也"라고 한 고사에서 온 말로써, ‘미인의 걸음걸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연보(蓮步), 금련보(金蓮步)라고 한다.
54) 瓊樓. 궁궐을 좋게 이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달속의 계수나무 옆에 있다는 누각, 즉 광한루(廣寒樓)를 가리키는 말이다.
55) 脉. 영(詠)의 오기(誤記)인 듯 하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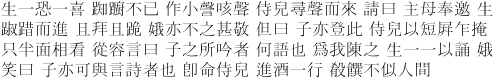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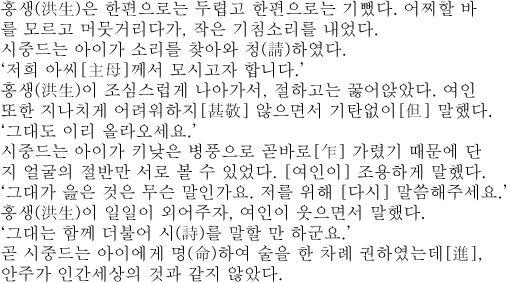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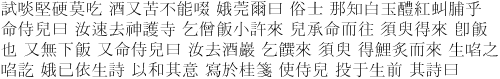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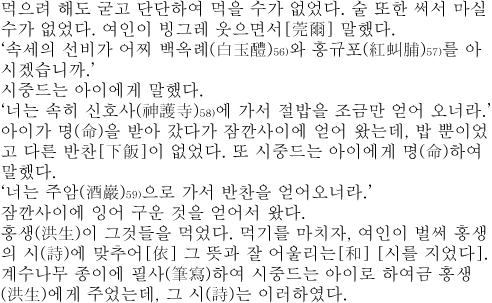 | |
|
| |
|
56) ‘백옥(白玉)처럼 맑은 술‘의 뜻. 醴는 대개 감주(甘酒)를 말하지만, ’맑은 술‘의 뜻도 있다.
57) 붉은 빛 규룡(虯龍)의 고깃살로 만든 육포(肉脯). 규룡(虯龍)은 어린 용(龍) 또는 아직 용(龍)이 되지 못하여 뿔이 없는 용(龍).
58) 고려시대 서경(西京), 즉 평양 서남쪽에 있었던 큰 절의 이름. 영명사(永明寺), 인왕사(仁王寺)와 더불어 평양(平壤)의 거찰(巨刹)에 속했다고 한다.
59) 평양 동북쪽 교외(郊外)에 있었다는 바위의 이름.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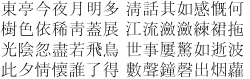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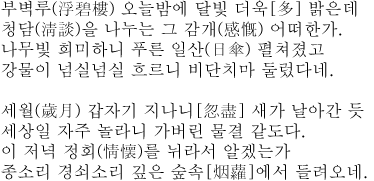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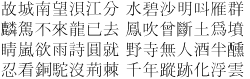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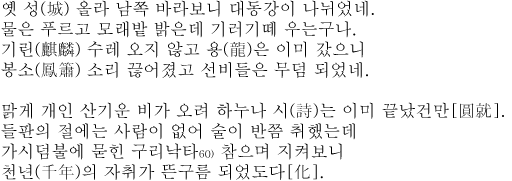 | |
|
| |
|
60) 銅駝沒荊棘. 銅駝는 서진(西晉) 때에 낙양(洛陽) 성문 밖에 세워진 구리를 녹여서 만든 낙타(駱駝)의 상(像). 진(晉)의 장수 삭정(索靖)이 성문을 나서다가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豫見)하고 구리 낙타를 가리키면서 ‘네가 곧 가시밭에 있게 될 것이다[銅駝荊棘]‘라고 말했다는 고사(故事)가 있다. 진서(晉書)의 삭정열전(索靖列傳)에 실려있는 말인데, 대개 나라가 망하거나 망할 것이 예견될 때에 쓰이는 말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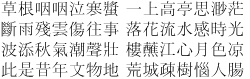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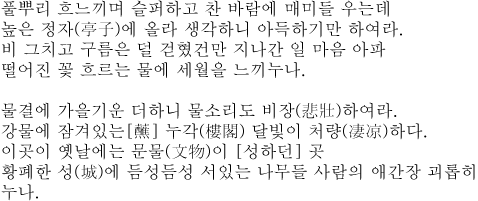 | |
|
| |
|
| |
|
| |
|
|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1 l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