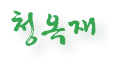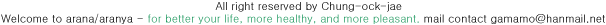|
|
|
|

| |
| |
|
 |
|
| 청오경(靑烏經) 4 / 청오선생(靑烏先生)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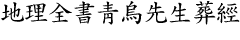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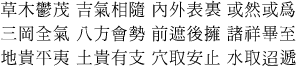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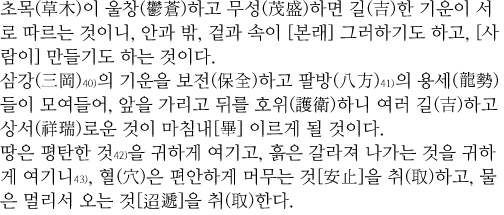 | |
|
| |
|
40) 세 언덕. 또는 세 봉우리. 여기에서는 뒤의 현무봉(玄武峰)과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의 세 봉우리를 가리킨다.
41) 사정방(四正方)과 사간방(四間方)을 함께 이르는 말.
42) 平夷. 夷에는 평탄하다는 뜻도 있다. 주룡(主龍)은 산줄기를 따라 행룡하지만 그 생기가 결취하는 혈(穴)의 전면(前面)에는 반드시 펑탄한 땅이 있어야 한다. 이를 명당(明堂)이라고 한다.
43) 산줄기가 좌우로 갈라져 나가서 겹겹이 좌청룡 우백호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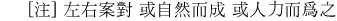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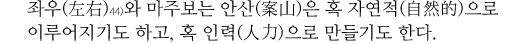 | |
|
| |
|
| 44) 좌청룡(左靑龍)과 우백호(右白虎).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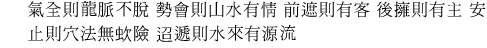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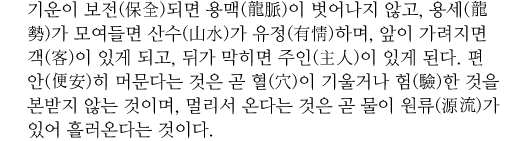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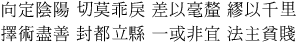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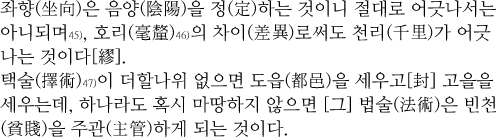 | |
|
| |
|
45) 切莫乖戾. 切莫은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고, 乖戾는 어긋나거나 어그러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46) 毫釐는 아주 적은 분량을 가리키는 말인데, 毫는 털끝을 가리키는 말이고, 釐는 자(尺)나 저울대의 눈금에서 1/100을 가리키는 아주 적은 단위를 말한다.
47) 길지(吉地)를 가리는 법술(法術).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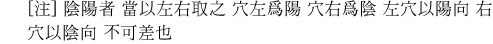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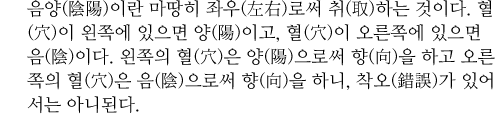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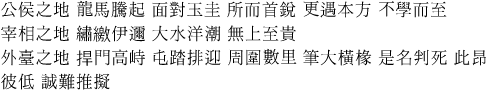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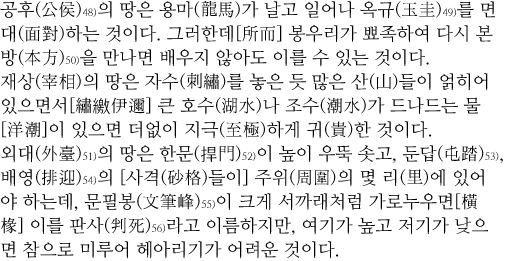 | |
|
| |
|
49) 옥(玉)으로 된 홀(笏). 또는 왕홀(王笏). 홀(笏)은 임금이 지니는 지팡이 또는 손부채 모양의 표지(標識)인데, 제후(諸侯)를 책봉(冊封)하는 증표(證票)로써 내려주기도 하였다. 여기는 옥규사(玉圭砂)의 뜻을 겸(兼)하는 중의어(重意語)로 쓰였다. 옥규사(玉圭砂)는 안산(案山)의 한 가지로써 곧 홀산(笏山)을 가리킨다.
50) 本方에 대하여는 양균송(楊筠松)의 주석(註釋) 참조.
51) 한(漢)나라의 삼대(三臺)의 하나. 삼대(三臺)는 상서(尙書), 어사(御使), 알자(謁者)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인데, 각각 중대(中臺), 헌대(憲臺), 외대(外臺)라고 하였다. 외대(外臺)라고 하는 까닭은 알자(謁者)가 주로 지방이나 국외(國外)에 사신(使臣)으로 가는 직책(職責)이었기 때문이다.
52) ?門은 사격(砂格)에서 수구(水口)의 한 가지를 말한다. 마치 문(門)의 양쪽 기둥처럼 커다란 바위나 봉우리가 마주서서 바라보는 형국을 가리킨다. ?門이 깃발의 형상를 하면 길격(吉格)으로 간주한다.
53) 둔군(屯軍). 둔군(屯軍)에 대하여는 아래의 주 참조.
54) 영종(迎從). 영종(迎從)에 대하여는 아래의 주 참조.
55) 안산(案山)의 한 가지. 붓처럼 생긴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56) 판사필(判死筆). 판사필(判死筆)에 대하여는 아래의 주 참조.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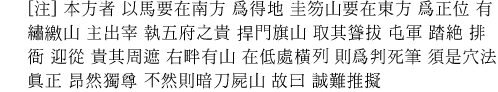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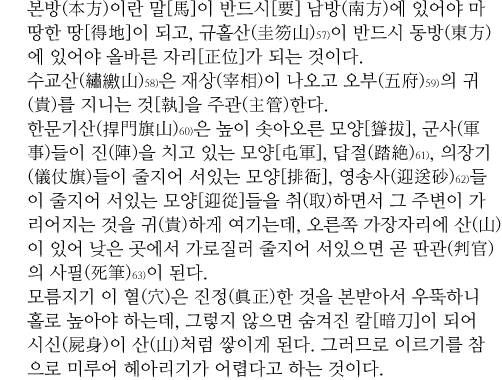 | |
|
| |
|
57) 상게주 참조.
58) 수많은 산(山)들이 자수(刺繡)를 놓은 듯 서로 가까이 이리저리 얽히어 서있는 산(山)들을 말한다.
59) 한(漢)나라의 다섯 관직(官職)을 아울러 이르는 말. 즉 태부(太傅),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대장군(大將軍)의 다섯 관직.
60) 한문(?門)에 대하여는 상게주 참조. 한문기산(?門旗山)은 한문(?門)이 깃발의 형상으로 되어있는 산(山).
61) 수 없다. 자의(字意)는 ‘밟고 끊는 것’이니 전후의 맥락으로 볼 때에 아마도 군사(軍事)들이 훈련(訓練)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한다.
62) 사격(砂格)에서 주룡(主龍)의 통과하는 과협(過峽) 주위의 모양을 가리킨다. 양팔을 벌린 능선이 앞뒤에서 팔자(八字)의 형태로 과협(過峽)을 보호하듯 감싸안는 것을 말한다.
63) 判死筆. 명부(冥府)의 생사판관(生死判官)이 죽어야할 사람과 살아야할 사람을 가름하여 생사부(生死簿)에 기입(記入)할 때에, 살아야할 사람의 이름은 생필(生筆)로 쓰고, 죽어야할 사람의 이름은 사필(死筆)로 쓴다는 설화(說話)가 있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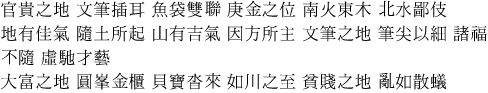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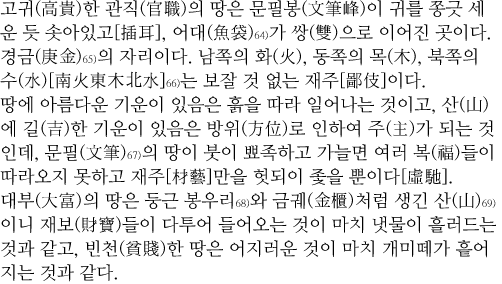 | |
|
| |
|
64) 감여(堪輿)에서 두 개의 둥근 봉우리가 쌍(雙)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어대사(魚袋砂)라고 한다. 본문에서 ‘어대(魚袋)가 쌍(雙)으로 이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어대사(魚袋砂)를 가리키는 말인데, 어대사 그 자체가 쌍(雙)으로 이어진 봉우리이다.
65) 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방위(方位)의 오행(五行)에서 서방(西方)은 금(金)이 되며, 팔괘(八卦)의 방위(方位)에서 경(庚)이 서쪽이 되므로 아울러 경금(庚金)이라고 하는 것이다.
66) 방위(方位)의 오행(五行)에서 남방(南方)은 화(火)가 배당되고, 동방에는 목(木)이 들어가며, 북방(北方)에는 수(水)가 들어간다. 모두 방위(方位)를 가리키는 말이다.
67) 문필봉(文筆峰)이 아닌 ‘문장(文章)이 뛰어난 사람’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68) 圓峯. 사격(砂格)에서 봉우리가 둥근 것을 금성(金星)이라고 하는데, 금(金)은 곧 재물(財物)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속설(俗說)에 둥근 봉우리를 금산(金山) 또는 ‘돈산’이라고 한다.
69) 곧 금궤사(金櫃砂)를 말하는 것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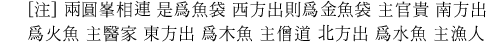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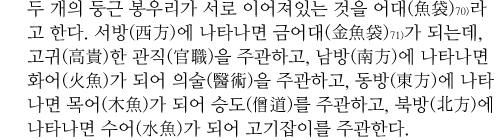 | |
|
| |
|
70) 어대(魚袋)는 본래 고관대작(高官大爵)들이 허리춤에 차는 물고기 모양의 신부(信符)를 말한다. 이 신부(信符)로써 대궐(大闕)의 출입이 가능한 것인데, 관리(官吏)의 신분(身分)이나 위계(位階)를 나타내는 용도로 쓰였던 어부(魚符)와는 다른 것이다.
71) 어대(魚袋) 가운데에서 가장 등급(等級)이 높은 것이다. 삼품(三品) 이상의 관리들이 패용(佩用)하며, 그 아래 오품(五品) 이상의 관리들이 패용하던 것은 은어대(銀魚袋)라고 하였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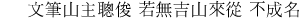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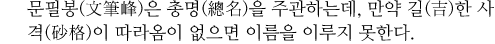 | |
|
| |
|
| |
|
|
청오경(靑烏經) 3 l
청오경(靑烏經) 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