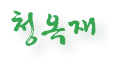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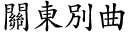
 | |
| |
|
 |
|
| 관동별곡 / 안축 |
|
| |
|
|
|
| [3]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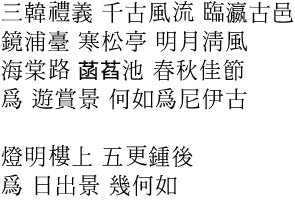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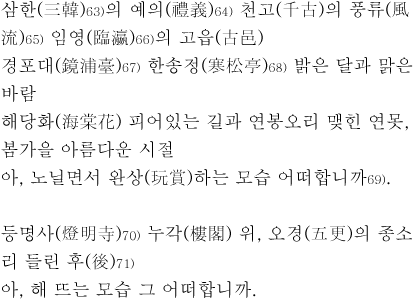 | |
|
| |
|
63) 구한(九韓)의 종족(宗族)에서 중심(中心)이 되는 세 종족(宗族). 즉 북서(北西) 만주(滿洲)와 왜(倭)를 제외(除外)한 북서(北西) 간도(間道)와 한반도(韓半島)에 정착(定着)한 세 종족(宗族)을 말한다. 개인적(個人的)인 추론(推論)이다.
64) 여기서 예의(禮義)는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예의와 다르다고 본다. 조선(朝鮮)의 예의(禮義)는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기초(基礎)한 것으로써, 반상(班常)의 토대 위에 사족(士族)들이 지켜야할 것으로 치부된 다소 고식적이고 고답적이면서 권위적이었지만, 고려의 예의는 풍속적인 법도와 예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65) 풍류(風流)는 사람이 아취(雅趣)를 즐기는 것을 말하지만, 본문의 뜻은 천고(千古)의 풍광(風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그 풍광(風光)을 즐기는 사람들로 아울러 생각할 수도 있다.
66) 강원도(江原道) 강릉(江陵)의 옛이름.
67) 강원도(江原道) 강릉(江陵)의 경포호(鏡浦湖) 북안(北岸)에 있는 언덕 위의 누대(樓臺).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 지금의 경포대 해수욕장과는 다른 것이다.
68) 강원도(江原道) 강릉(江陵)의 하시동리에 있었던 정자(亭子). 경포대(鏡浦臺)와 같이 일컬어졌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송정(松亭), 녹정(?亭), 두정(荳亭), 녹두정(綠荳亭)이라고도 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신라(新羅) 사선(四仙)의 한 사람인 술랑(述郞)과 그의 무리들이 노닐던 곳이라고 한다.
69) 원문은 何如爲尼伊古. ‘어떠하니잇고’의 이두식(吏讀式) 표기(表記).
70) 낙가사(洛伽寺)의 고명(古名). 즉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 신라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진신사리(眞身舍利) 3과(顆)를 3개의 석탑에 모시고 창건하였는데, 그 하나는 현재의 오층석탑이고 다른 하나는 멸실되었으며, 나머지를 수중탑(水中塔)으로 조성하고 수다사(水多寺)라 이름하였다. 뒤에 불이 탄 것을 나말(羅末)에 중건하여 등명사(燈明寺)라고 하였다. 뒤에 폐사되었다가 중창한 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 상주하는 곳이라 하여 낙가사(洛伽寺) 또는 등명낙가사(燈明洛伽寺)라고 하였다. 오늘날의 낙산사(洛山寺)이다. 낙가사(洛伽寺)의 이층(二層) 누각(樓閣)에 오르면 일출(日出)을 가장 아름답게 제일 먼저 볼 수 있다고 한다.
71) 원문은 五更鍾後. 오경(五更)은 새벽무렵. 종(鐘)은 파루(罷漏). 밤 7시경의 초경(初更)의 종을 쳐서 성문을 닫고, 새벽 5시 경의 오경(五更)에 종을 쳐서 성문을 닫았다. 초경(初更)의 종소리를 인경(人定)이라 하고, 오경(五更)의 종소리를 파루(罷漏)라고 하는데, 바닷가에서는 종소리가 없으므로 그저 시각(時刻)을 말한 것일 뿐이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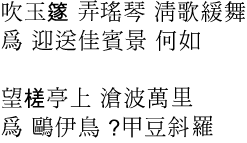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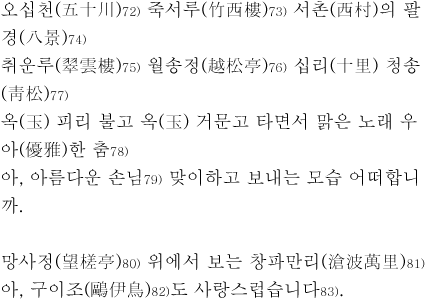 | |
|
| |
|
72) 강원도(江原道) 삼척(三陟)을 지나 동해(東海)로 흘러드는 강(江) 이름. 이외에 경상북도(慶尙北道) 영덕(寧德)에도 오십천(五十川)이라는 동명(同名)의 강줄기가 있다.
73) 강원도(江原道) 삼척(三陟)에 있는 누각(樓閣). 지금도 있다.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 관동팔경 가운데 바닷가가 아닌 강가의 풍경으로는 죽서루(竹西樓)가 유일하다. 누각의 동쪽에 죽장사라는 절이 있고, 또 삼척(三陟)의 명기(名妓) 죽죽선녀의 집이 부근에 있어서 죽서루(竹西樓)라고 하였다고 한다. 서(西)를 서(棲)로 음차(音借)하면 ‘죽(竹)이 살고있다’는 뜻이 된다.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라고도 한다.
74) 서촌(西村)은 알 수 없음. 오십천(五十川) 죽서루(竹西樓) 인근 오십천 천변(川邊)의 경관을 오늘날에도 삼척팔경(三陟八景)이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죽서루(竹西樓)가 동헌(東軒)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음으로 하여 서촌(西村)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서촌팔경은 竹藏古寺, 巖控淸潭, 依山村舍, 臥水木橋, 牛背牧童, 壟頭?婦, 臨流數魚, 隔墻呼僧인데, 이중 臥水木橋는 李達衷, 安軸, 李穀, 辛? 金壽寧의 5명이 시(詩)로 읊었다. [신증승람 권44]’
7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작자인 안축(安軸)의 기문(記文)이 실려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선사군(울진의 옛 명칭) 고을 남쪽 흰모래 평평한 뚝에 어린 소나무 수천그루가 있었는데, 현지 사람에게 "저 소나무들이 다 자란 후에 정자를 지으면 그 운치가 한송(寒松), 월송(越松)의 두 정자가 되어 서로 갑을(甲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존무사 박공이 새 누대를 지었는데 곧 옛날 내가 생각했던 그곳이다. 항상 이 누대에 오르고 싶었는데 지금 다행히 이 지역에 다시 나와 누대에 오르니 그 맑고 그윽한 경치야 말로 이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76) 위 취운루(翠雲樓) 주해(註解) 참고(參考).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 월송정(月松亭)이라고도 한다. 신라(新羅) 사선(四仙)이 이 곳에서 선유(仙遊)했다고 한다.
77) 취운루(翠雲樓)와 월송정(月松亭)의 사이에 울창한 송림(松林)이 있었다. 취운루(翠雲樓) 주해(註解) 참고(參考).
78) 사선(四仙)과 낭도(郎徒)의 무리들이 노니는 모습.
79) 신라(新羅) 사선(四仙).
80) 경상북도(慶尙北道) 평해(平海)에 있었던 정자(亭子). 평해팔경(平海八景)의 하나. 고려말(高麗末)에 지어졌다. 망사정(望?亭)을 읊은 성현(成俔)의 시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사정(望?亭) 박망후의 신선 뗏목/ 하늘 위의 나그네라/ 그 손에 베틀 괴는 돌 가지고 왔다네(후략)’ 사(?)는 ‘뗏목’. 박망후(博望侯)는 후한(後漢)의 장건(張騫). 망사(望?)는 장건(張騫)이 한무제의 명을 받아 황하의 연원(淵源)을 찾기 위해 뗏목을 타고 황하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났다는 고사(故事)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선 만나기를 바란다는 뜻.
81) 망망대해(茫茫大海).
82) 알 수 없음. 갈매기인 듯.
83) 문은 ?甲豆斜羅. ‘자깝두사라’의 이두식(吏讀式) 표기(表記). 즉 ‘자깝스럽니다’의 뜻. ‘자깝스럽다’는 어린 아이가 어른 행세를 하는 귀여운 모습, 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 대신 ‘藩’을 넣어 藩甲豆斜羅, 즉 ‘반갑두사라’, ‘반갑다’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가 원문(原文)이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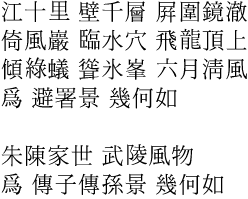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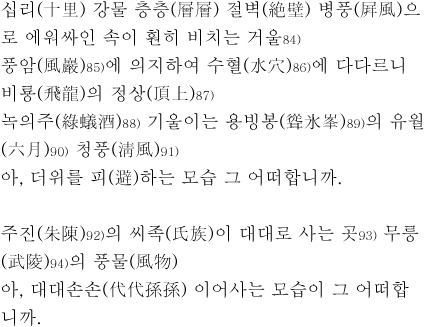 | |
|
| |
|
84) 강원도(江原道) 정선(旌善)의 풍광(風光)을 묘사(描寫)한 것이다.
85) 알 수 없음. 풍암(風巖)은 산속 바위굴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곳. 여름철 피서지(避暑地)이다.
86) 알 수 없음. 수혈(水穴)은 산속 바위틈에서 시원한 물과 바람이 나오는 곳. 여름철 피서지(避暑地)이다.
87) 비룡산(飛龍山)의 정상(頂上). 알 수 없다.
88) 녹의(綠蟻)는 술개미. 술구더기. 술이 익으면서 위로 떠오르는 밥알과 푸른색 공기방울.
89) 알 수 없다. 용빙(聳氷)은 얼음 고드름.
90) 한 여름. 음력(陰曆) 유월(六月)은 양력(陽曆)의 팔월(八月) 삼복더위에 해당된다.
91) 청풍(淸風)은 본래 맑은 바람이지만, 청(淸)에는 ‘시원하다’는 뜻이 있으므로, ‘한여름철에 불어오는 맑고도 시원한 바람’의 뜻이 된다.
92) 강원도(江原道) 정선(旌善)의 옛이름. 옛날 주씨(朱氏)와 진씨(陳氏)의 두 씨족(氏族)만이 살았으므로 주진(朱陳)이라고 한다. 도원(桃園)이라고도 불리웠다.
93) 원문은 家世. 대대로 이어산다는 뜻.
94) 무릉도원(武陵桃源). 정선(旌善)의 고명(古名)에 도원(桃園)이 있으므로 도연명(陶淵明)의 무릉도원(武陵桃源)에 비유(比喩)한 것이다.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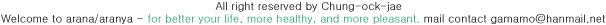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