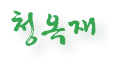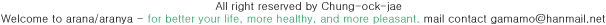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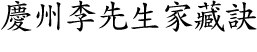
| |
| |
|
 |
|
|
| 경주이선생가장결(慶州李先生家藏訣) (2) /
[1] [2]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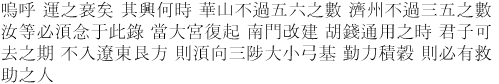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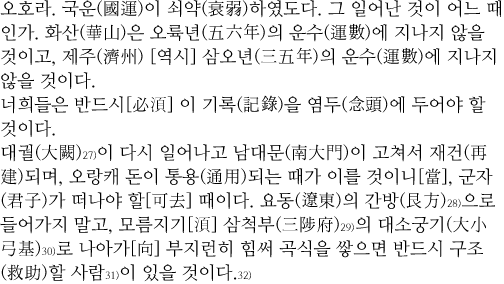 | |
|
| |
|
27) 大宮은 대궐(大闕)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중의어(重意語)로써 대조(大朝), 즉 임금의 뜻으로도 쓰였다.
28) 동북방(東北方)을 말한다.
29) 강원도 삼척(三陟)을 말한다.
30) 大小弓基. ‘크고작은 궁기(弓基)’인지, 아니면 ‘대궁(大弓)의 터’와 ‘소궁(小弓)의 터’를 아울러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이 ‘大小弓基’가 삼척(三陟)의 첩첩산중 오지에 있는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한편 추론할 만 할 것이다. 우선 대소(大小)는 부부(夫婦)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준경묘와 영경묘는 각각 태조 이성계의 5대조 내외(內外)을 모신 곳이다. 준경묘가 부(夫)이고 영경묘가 처(妻)의 묘이다. 그러므로 대소(大小)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궁기(弓基)는 ‘활터’라는 뜻인데, 여기에서의 ‘활’은 넓다는 뜻의 ‘활(闊)’과 동음(同音)이다. 영조 24년에 청주괘서사건의 주모자 이지서(李之曙)가 국문(鞠問)에서 궁궁(弓弓)의 뜻이 활활(闊闊)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곳의 지명이 본래 황기리(皇基里)였고, 이를 소리가 나는대로 적으면 ‘활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활(闊)은 다시 궁(弓)과 동의어로 되어 궁기리(弓基里)라 불리우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지명은 활기리(活耆里)이다.
31) 救助之人. ‘구조해줄 사람’인지, ‘구조를 받아야할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32)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토정가장결에서는 요동(遼東)의 동북방으로 나아가라고 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요동의 동북방으로 들어가지 맗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서로 다른 차이점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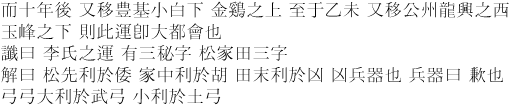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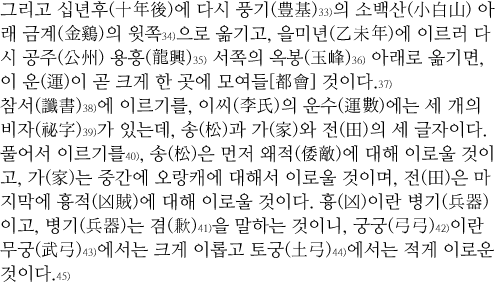 | |
|
| |
|
33) 풍기군(豊基郡). 오늘날의 경북 영주 풍기면이다.
34) 金鷄之上. 金鷄는 오늘날에는 보통 경북 영주시 풍기면의 금계리(金鷄里)를 말한다. 金鷄之上.은 금계(金鷄)의 위쪽인데, 금계리의 위쪽에는 욱금리와 삼가리가 있다.
35) 알 수 없다.
36) 알 수 없다.
37) 토정가장결의 내용과 같으나, 마지막의 ‘則此運卽大都會也’의 구절이 토정가장결에는 ‘此則大都會也’로 되어있다. 한두 글자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 뜻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38) 어떠한 참서(讖書)인지는 알 수 없다.
39)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글자.
40) 解曰. 앞의 참서(讖書)의 내용을 풀어서 주해(註解)하였다는 것인지, 또다른 책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토정가장결에서는 본문과 관련은 없으나 방해(方解)라는 책이름이 나온다.
41) 겸(?)은 대개 흉년(凶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다음의 문장에서도 ‘九年之?’이라 하여 흉년(凶年)의 뜻으로 쓰였다. 본문에서는 ‘凶者兵器 兵器曰?’이라고 하였는데, 兵器는 병장기, 곧 군사들의 무기(武器)를 말한다. 무기(武器)가 어찌하여 ‘흉년(凶年)’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42) 궁궁(弓弓)에 대하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구구한 해석이 있는데,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는 그럴 듯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격암유록에 근거하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격암유록 자체가 정본(正本)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비기(秘記)를 살펴보면 궁궁(弓弓)은 대개 땅을 가리키는 말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두 가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뜻 역시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상게주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무궁(武弓)과 토궁(土弓) 두 가지를 함께 일컫는 말로 쓰인 듯 하다.
43) 앞에 나온 궁궁자(弓弓者)의 하나로 보인다. 땅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44) 앞에 나온 궁궁자(弓弓者)의 하나로 보인다. 땅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45) 단락(段落)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토정가장결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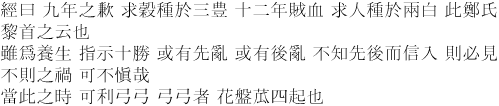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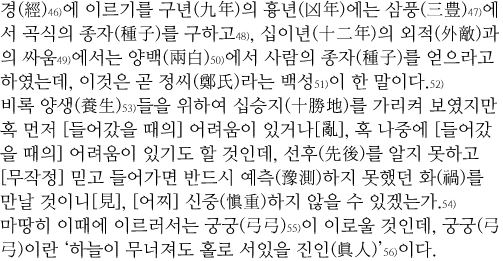 | |
|
| |
|
46) 알 수 없다. 아마도 정감록(鄭鑑錄)을 가리키는 듯 하다. 경주이선생가장결(慶州李先生家藏訣)에도 ‘經曰 九年之? 求穀種於三豊 十二年賊血 求人種於兩白 此鄭氏黎首之云也’ 라고 하는 같은 말이 실려있다.
47) 알 수 없다. 흉년에도 곡식의 종자를 구할 수 있는 세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설에는 무주(茂朱)의 무풍(茂豊)과, 괴산(槐山)의 연풍(延風)과 영주의 풍기(豊基)의 세 곳을 꼽기도 한다.
48) 求穀種於三豊. 정감록(鄭鑑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沁曰 求穀種於兩白 此十處 兵革不入 凶年不入 (심이 말하기를, 곡식의 종자를 양백에서 구하는데, 이 열 곳은 병화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양백(兩白)은 삼풍(三豊)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경주이선생가장결(慶州李先生家藏訣)에도 같은 말이 실려있다. 남사고(南師古)의 저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격암유록에는 삼풍(三豊)과 양백(兩白)이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는데, 격암유록 자체가 전거(典據)나 인용(引用)의 대상으로 삼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참고할 것이 못 된다.
49) 賊血. 외적(外敵)과 싸워 피를 흘린다는 뜻이다. 토정가장결에는 ‘兵火’로 되어있다.
50) 소백산(小白山)과 태백산(太白山)을 말한다.
51) 鄭氏黎首之云耳. 黎首는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冠)을 쓰지 않은 검은 머리’라는 뜻이다. 黔首라고도 한다. 黎와 黔은 모두 검다는 뜻이다. ‘鄭氏黎首’를 ‘정씨(鄭氏) 백성’ 또는 ‘정씨의 백성’이라고 풀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박적이다. 여기서 鄭氏와 黎首는 동격(同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벼슬하지 아니한 정씨(鄭氏)’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2) 토정가장결의 문장과 내용이 동일하다.
53) 토정가장결에는 백성이라는 뜻의 창생(蒼生)으로 되어있다.
54) 토정가장결과 같은 내용이다.
55) 여기에서의 궁궁(弓弓)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이다. 사람을 가리킬 때의 궁궁(弓弓)은 성인(聖人)이나 진인(眞人)을 가리키는 듯 하다.
56) 花盤苽四起. 알 수 없다. 아마도 ‘落盤孤四乳’의 오기(誤記)일 듯 하다. ‘落盤孤四乳’도 알 수 없기는 매한가지이나, 그러나 ‘비기(秘記)의 비기(秘記)다운 해석(解釋)‘이라는 전제하에서 굳이 추론하자면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落盤은 ’발밑의 땅이 움푹 꺼지는 것‘이다. 또는 ’위쪽을 버티어 주던 반석(盤石)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땅이 꺼지거나 무너지는 것은 곧 하늘이 꺼지거나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孤은 독(獨), 즉 ’홀로‘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四乳는 성인(聖人)을 말한다. ’네 개의 젖‘이라는 뜻인데, 주문왕(周文王)이 네 개의 젖을 가졌다고 하여 사유(四乳)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落盤孤四乳는 ’땅이 꺼지거나 하늘이 무너져도 홀로 서있을 만한 성인(聖人) 또는 진인(眞人)‘을 말하는 것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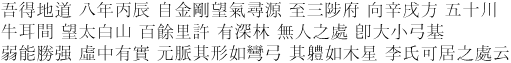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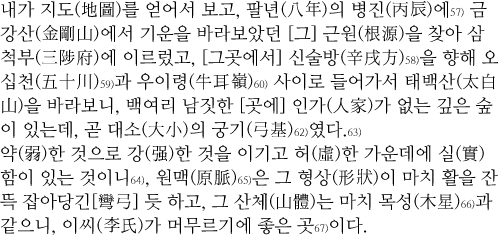 | |
|
| |
|
57) 八年丙辰. 丙辰은 곧 병진년(丙辰年)을 말하는 것이다. 八年은 알 수 없다. ‘팔년 동안의 병진(丙辰)’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팔년(八年)의 병진(丙辰)’이라는 해석이 맞을 것인데, 연호(年號)를 쓰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원년(元年)으로 삼은 팔년(八年)인지 알 수 없다.
58) 서(西)와 서북(西北) 사이의 방위. 즉 서북서(西北西)의 방향이다. 그러나 삼척부에서 신술방(辛戌方), 즉 서북방을 바라보거나 들어가면 오십천(五十川)과 반대의 방향이 된다.
59) 태백산 동쪽의 백병산에서 발원하여 삼척을 거쳐 동해로 흘러드는 물줄기의 이름.
60) 牛耳. 알 수 없다. 그러나 강원도 삼척 신기면 대이리(大耳里)의 덕항산 서쪽 기슭에 귀내미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를 한자(漢字)로 표기하면 ’牛耳谷‘이 된다. 또 그 뒤쪽의 봉우리를 우이령(牛耳嶺)이라고 한다.
61) 五十川牛耳間. 여기에서 牛耳를 우이령(牛耳嶺)으로 본다면 오십천과 우이령 사이는 해발 1,073m의 덕항산이 된다.
62) 大小弓基. 상게주 참조. 다만 본문의 오십천 우이령 사이의 덕항산은 상게주에서 말한 준경묘 영경묘의 남쪽에 있다. 그러므로 본문의 궁기(弓基)는 상게주에서 말하는 궁기(弓基)와 전혀 다른 궁기(弓基)가 된다.
63) 토정가장결의 내용과 같다.
64) 弱與勝强 處中有實. 弱與勝强은 이유제강(以柔制剛)이라는 말이고, 處中有實는 허허실실(虛虛實實)이라는 말이다.
65)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토정가장결에도 원맥(原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앞뒤의 문장의 연결이 끊겨진 듯 하다.
66) 천문(天文)에서의 목성(木星)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수지리에서의 목성(木星)을 말하는 것이다. 풍수에서는 산(山)의 형상, 즉 산체(山體)를 다섯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를 오성(五星)이라 한다. 그 가운데 목성(木星)은 원추형으로 뾰족하게 솟아오른 산체(山體)를 가리키는 말이다.
67) 李氏可居之處. 토정가장결에는 ‘木姓可居之處’로 되어있다.
| |
|
| |
|
| |
|
|
경주이선생가장결(慶州李先生家藏訣) 1 l
비결집록(秘訣集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