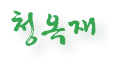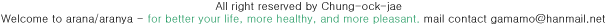|
|
|

 | |
| |
|
 |
|
| 촉도난(蜀道難) / 이백(李白) / 칠언고시(七言古詩) / 악부(樂府)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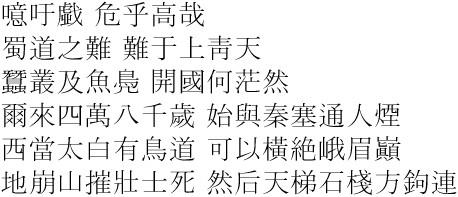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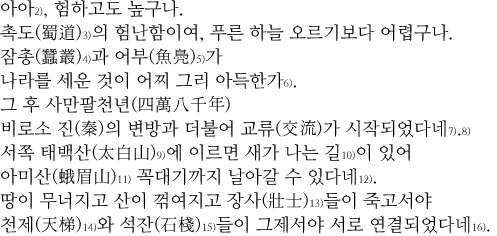 | |
|
| |
|
1) 촉(蜀)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렵구나.
2) 噫?戱. 噫와 ?와 戱는 모두 감탄사이다. 특히 본문에서는 놀라웁거나 놀랐을 때에 쓰이는 감탄사가 아니라 힘들 때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쓰였다. ‘어휴’, 또는 ‘후유’, ‘휘휘’ 정도의 뜻이다.
3) 촉(蜀)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한다. 장안(長安)에서 진령산맥을 넘어 파촉(巴蜀)의 성도(成都)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진(秦)은 이 길을 금우도(金牛道)라고 하였다. 길이 매우 험한 것으로 유명하며, 검각(劍閣)과 잔도(棧道)의 험로(險路)가 특히 유명하다.
4) 촉(蜀)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한 가지. 전설에 따르면 촉(蜀)에는 본래 촉국(蜀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잠총(蠶叢)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워서 촉나라의 선조(先祖)가 되었다고 한다.
5) 촉(蜀)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한 가지. 전설 속의 나라인 촉국의 선조 잠총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또는 백관(柏灌)이 잠총의 뒤를 이었고, 어부가 또한 백관의 뒤를 이었다고도 한다.
6) 何茫然. 茫然은 아득하게 먼 것을 가리키는 말. 어리둥절 한 모습을 가리킬 때에도 쓰인다.
7) 通人煙. 人煙은 인가(人家)의 밥짓는 연기라는 뜻이다. 通人煙은 ‘민가의 밥짓는 연기가 통하였다’는 뜻인 인적왕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8) ‘不與秦塞通人煙‘로 씌여진 본도 있다. 뜻은 정반대이다.
9) 진령산맥의 주봉(主峰). 장안에서 촉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있다. 봉우리가 항상 눈에 덮여있어 태백(太白)이라고 한다.
10) 鳥道. ‘새가 날아다니는 길’의 뜻인데, 대개는 ‘새나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험한 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본래의 뜻 그대로인 ‘새가 날아다니는 길’의 뜻으로 쓰였다.
11) 촉(蜀)의 남쪽에 있는 고산(高山)의 이름. 도교(道敎)와 불교(佛敎)의 성지로 꼽힌다.
12) 橫絶. 하늘이나 바다 등의 넓은 곳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 본문의 태백산과 아미산 사이는 험한 길로 천리길이 넘으므로, 이 길로 사람이 다니기는 어렵고 새나 겨우 날아다닐 뿐이라는 뜻이다.
13) 힘이 세고 튼튼한 사람. 본문에서의 장사(壯士)는 전설상의 나라인 촉국(蜀國)의 다섯 장사(壯士)를 가리키는 말이다. 촉(蜀)에 다섯명의 역사(力士)가 있었는데, 능히 산(山)을 옮길 수 있었다. 진왕(秦王)이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촉왕에게 다섯명의 미녀를 보냈는데, 왕래할 길이 없으므로 촉왕이 다섯 역사(力士)들로 하여금 산을 깎고 땅을 메꾸어 길을 만들게 하였다. 마침내 길이 완성되어 장사들은 미녀와 함께 돌아왔지만, 도중에 큰 뱀을 만나 그 꼬리를 잡아당겼는데, 그로 인해 산이 무너지면서 장사와 미녀들이 모두 흙에 파묻혀 다섯 개의 고개를 이루었다고 한다. 전한(前漢)의 양웅(揚雄)이 지은 촉왕본기(蜀王本紀)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14)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 본문에서는 험한 낭떠러지를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의 뜻이다.
15) ‘돌로 된 잔도(棧道)’의 뜻. 잔도(棧道)는 낭떠러지의 허리를 따라서 선반처럼 걸쳐놓은 다릿길을 가리킨다.
16) 方鉤連. ‘바야흐로 갈고리처럼 연결되었다’는 뜻.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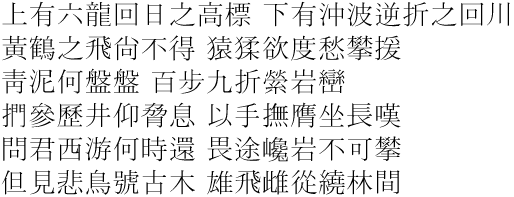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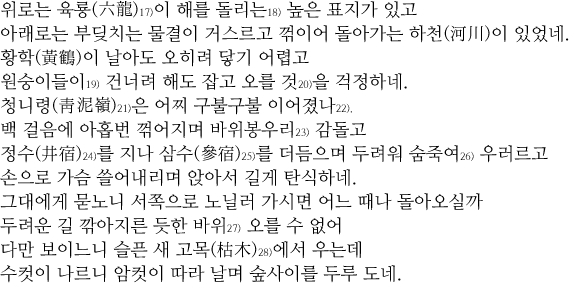 | |
|
| |
|
17) ‘여섯 마리의 용(龍)이 이끄는 수레‘라는 뜻. 신화(神話)에 의하면, 희화(羲和)가 함지(咸池)에서 깨끗이 씻어 부상(扶桑)의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던 열 개의 해 가운데 하나가 아침이 되면 여섯마리의 용(龍)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하늘로 떠올라간다고 하였다. 또 주역 건괘(乾卦)의 단사(彖辭)에 ’時乘六龍 以御天‘이라는 구절도 있다. ’때맞추어 육룡(六龍)을 타고 천도(天道)를 통어(統御)하는도다‘의 뜻이다.
18) 回日. ‘해를 돌린다’는 뜻인데, 육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에 오른 태양(太陽)이 한낮에 이르면 이곳의 고표(高標)를 깃점으로 하여 방향을 돌려 서쪽의 함지(咸池)를 향해 내려간다는 뜻이다. 고표(高標)는 여기에서는 촉(蜀)의 높은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19) 猿?. 猿과 ?는 모두 원숭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20) 攀援. 반연(攀緣)과 같은 뜻이다. 반연(攀緣)은 나뭇가지 등을 휘어잡고 의지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21) 장안(長安)에서 촉(蜀)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높은 고개. 아득히 높은 구불구불 길게 이어지고, 비가 오면 길이 진창이 되므로 청니령(靑泥嶺)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22) 盤盤. 구불구불 구부러진 모양을 가리키는 말.
23) 岩巒. 巒은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岩巒은 바위로 된 산봉우리.
24) 천상(天象)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남방칠수(南方七宿)의 첫번째 성좌. 삼수(參宿)와 가까이 있다. 분야(分野)에서는 익주(益州), 즉 촉(蜀)의 땅을 가리킨다.
25) 천상 이십팔수 가운데 서방칠수의 마지막 성좌. 정수(井宿)와 가까이 있다. 분야(分野)에서는 옹주(雍州), 즉 진(秦)의 땅을 가리킨다.
26) 脅息. 두려워서 숨을 죽이는 것.
27) ?岩. ?은 깎아지른 듯이 가파른 것.
28) 古木. 고목(枯木), 즉 시들어 죽은 나무의 뜻이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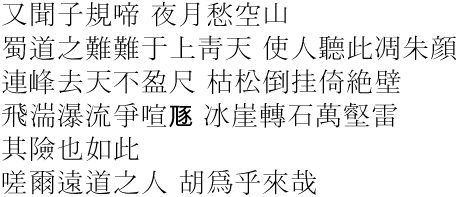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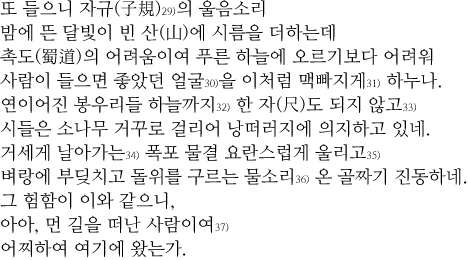 | |
|
| |
|
29) 두견새. 불여귀(不如歸), 귀촉도(歸蜀道), 망제혼(望帝魂)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촉(蜀)의 망제(望帝) 두우(杜宇)의 원통한 넋이 새가 변하였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30) 朱顔. 아름다운 얼굴을 가리키는 말이다.
31) 此凋. 凋는 시들거나 쇠락하는 것을 가리킨다.
32) 去天. ‘하늘이 가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去는 여기에서 ‘相去’의 의미로 쓰였다.
33) 不盈尺. ‘자(尺)을 채우지 못한다‘는 뜻이니, ’한 자(尺)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자(尺)는 약 30센치미터 정도.
34) 飛湍. 湍은 ‘여울’의 뜻이나,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모양을 가리키기도 한다.
35) 爭喧?. ‘돼지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라는 뜻인데, 물이나 바람소리가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을 가리킨다.
36) ?崖轉石. ‘?崖轉石’으로 씌여진 본도 있다. 아마도 얼음이라는 뜻의 빙(?)은 오기(誤記)인 듯 하다. 여기에서는 ‘?崖轉石’으로 보았다. ?는 물소리를 가리키고, ‘崖轉石’은 ‘벼랑에서 바위로’라는 뜻이다.
37) 遠道之人. 遠道는 ‘먼 길’이라는 뜻이다. 遠道之人은 ‘먼 길을 가는 사람’의 뜻이다. 之는 ‘가다’의 뜻이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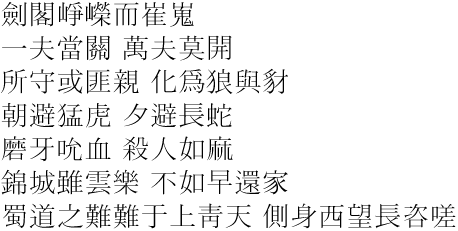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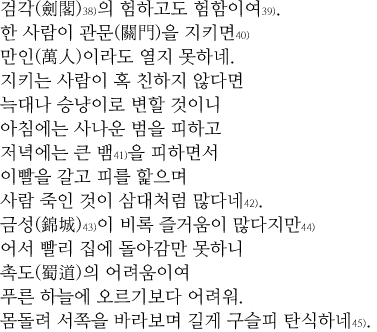 | |
|
| |
|
38) 촉도(蜀道)의 중간에 있는 요새. 검문관(劍門關)이라고도 한다. 대검산(大劍山)과 소검산(小劍山) 사이에 있다. 본문에서의 검각(劍閣)은 요새로서의 검각과, 대검산과 소검산을 아울러 가리키는 중의어(重意語)로써 쓰였다.
39) ?嶸而崔嵬. ‘?嶸하고도 崔嵬하다’는 뜻인데, ?嶸과 崔嵬은 모두 산세가 한껏 가파르면서도 아득하게 높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40) 當關. 관문을 담당한다는 말이다.
41) 長蛇. ‘긴 뱀’의 뜻이다.
42) 如麻. 麻는 곧 ‘삼’을 말하는데, ‘삼’의 줄기를 ‘삼대’라고 한다. 보통 많은 것을 가리킬 때에 ‘삼대같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43) 촉(蜀)의 성도(成都)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래는 촉금(蜀蜀)이라고 하는 질좋은 비단의 생산지였던 성도 남쪽의 금관성(錦官城)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44) 雖雲樂. 雲樂은 ‘즐거움이 구름처럼 많다’는 뜻이다.
45) 長常咨嗟. 咨嗟는 ‘슬퍼하며 탄식하다’의 뜻이다. ‘常咨嗟’으로 씌여진 본도 있다.
| |
| |
|
|
석어호상취가병서(石魚湖上醉歌幷序) l
장상사이수지일(長相思二首之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