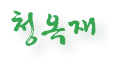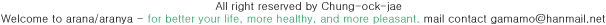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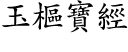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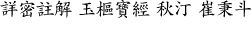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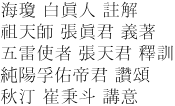 | |
|
| 상밀주해(詳密註解) 옥추보경(玉樞寶經) / 재옥청천중장(在玉淸天中章) 제이(第二)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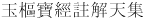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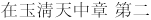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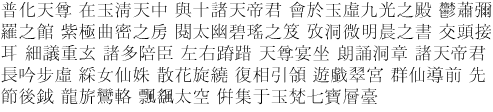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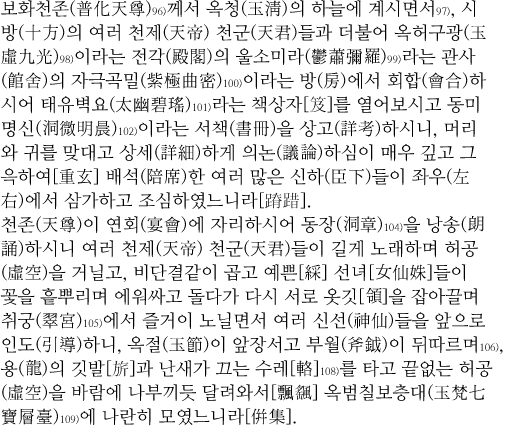 | |
|
| |
|
97) 普化天尊 在玉淸天中. 도장본(道藏本)에는 ‘普化天尊’이 빠져있다.
98) 구기(九氣)의 빛이 나오는 옥청천(玉淸天)이라는 뜻이다.
99) 鬱蕭는 울창하여 빽빽하게 보이는 모양이고, 彌羅는 두루 널리 퍼져있는 모양이다.
100) 紫極은 북극성(北極星)이다. 曲密 역시 곡진(曲盡)하게 빽빽한 모양이다.
101) 太幽는 곧 대유(大幽)이다. 碧瑤는 푸른 빛을 띠는 아름다운 옥(玉)이다.
102) 洞과 微와 明은 모두 밝다는 뜻이다. 晨은 ‘새벽’의 뜻이다.
103) ??은 모두 공손하면서도 삼가하고 조심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104) 경전(經典)의 말씀. 또는 신주(神呪).
105) 푸른 비취색으로 된 궁전.
106) 先節後鉞. 절(節)과 월(鉞)은 모두 위의(威儀)를 나타내거나 직임(職任)을 나타내는 의장(儀仗). 절(節)은 깃발을 말하고, 월(鉞)은 도끼모양의 것을 말하는데, 행렬을 지을 때에는 절(節)이 앞서고 월(鉞)이 뒤따른다.
107) 龍?. 붉은빛으로 된 비룡(飛龍)이나 강룡(降龍)의 모습을 수놓은 깃발. 임금을 상징한다.
108) 鸞輅. 鸞은 봉황새와 비슷한 상상상(想像上)의 새의 이름. 輅은 작은 수레.
109) 옥범(玉梵)의 칠보(七寶)로 된 높은 대(臺)의 뜻이다. 玉梵은 알 수 없다. 七寶는 일곱가지의 보석.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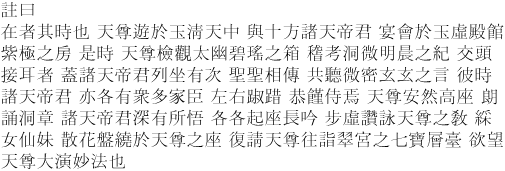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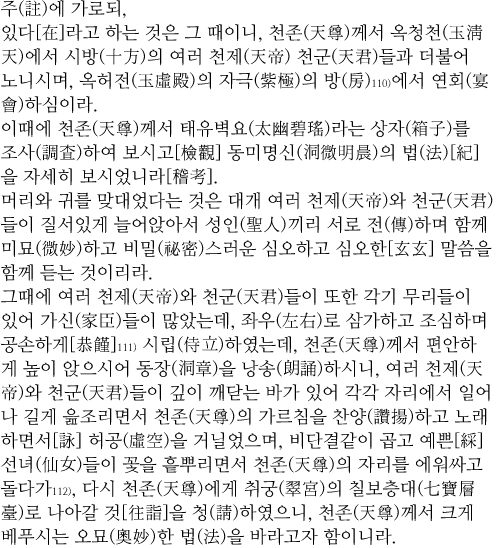 | |
|
| |
|
110) 곧 본문에 나온 ‘玉虛九光之殿 鬱蕭彌羅之館 紫極曲密之房’를 말한다.
111) 본문의 ‘恭饉’은 난문(難文)이다. 알 수 없다. 아마도 ‘공근(恭謹)’의 오기(誤記)인 듯 하다.
112) 盤繞. 본문에서 盤은 난문(難文)이다. 앞의 산화(散花)에 연결하여도 역시 난문(難文)이 된다. 차라리 본장(本章)의 말씀 가운데의 ‘散花旋繞’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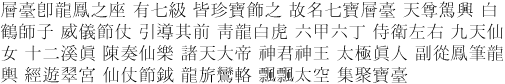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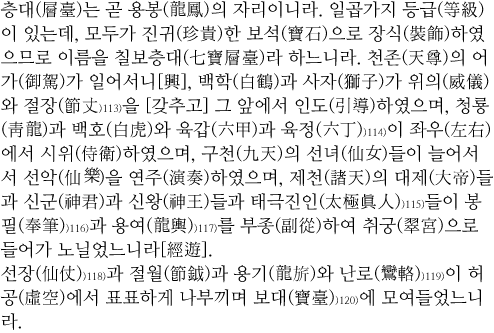 | |
|
| |
|
113) 곧 의장(儀仗)이다.
114) 六甲六丁. 곧 육갑신장(六甲神將)과 육정신장(六丁神將)을 가리킨다.
115) 알 수 없다. 아마도 수행(修行)의 경지가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어 최상의 경지에 이르른 사람을 가리키는 듯 하다.
116) 임금이 내리는 조서(詔書)를 달리 가리키는 말.
117) 임금이 타는 수레. 어가(御駕).
118) 선계(仙界), 즉 천계(天界)의 의장(儀仗).
119) 龍?鸞輅에 대하여는 상게주 참조.
120) 앞에 나온 칠보층대(七寶層臺)를 가리키는 말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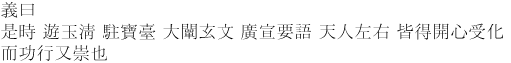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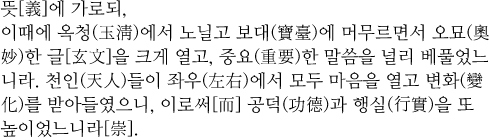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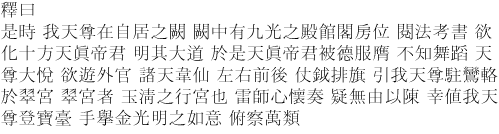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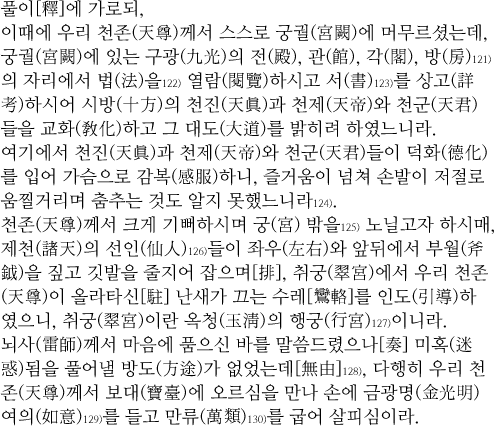 | |
|
| |
|
121) 곧 본문의 ‘玉虛九光之殿 鬱蕭彌羅之館 紫極曲密之房’를 차례대로 가리키는 것이다.
122) 곧 본문의 ‘太幽碧瑤之?’이다. ?은 ‘책을 담은 상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자체로써도 ‘비급(秘?)’ 등의 경우와 같이 ‘책’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123) 곧 본문의 ‘洞微明晨之書’이다.
124) 알 수 없다. 난문(難文)이다. 글자 그대로 억지로 끼워맞추면 ‘춤추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본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 ‘不知足之蹈之手之舞之’라는 말이 있다. 맹자(孟子) 이루상(離婁上) 편(篇)에 나오는 말인데,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손발을 움찔거리며 장단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맹자에 나오는 글귀의 의미를 차용(借用)하였다.
125) 外官. 문맥(文脈)을 따르자면 아마도 ‘외궁(外宮)’의 오기(誤記)인 듯 하다.
126) 諸天韋仙. 韋는 난문(難文)이다. 그리하여 따로 해석(解釋)하지 않았다.
127)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에 임시로 머무는 별궁(別宮).
128) 疑無由以陳. 본문은 난문(難文)이다. 도저히 풀어낼 길이 없어 고심(苦心) 끝에 이와같이 풀었으니, 제현(諸賢)께서는 마음껏 비웃으시기 바란다.
129) 手擧金光明之如意. 金光明은 ‘금빛으로 반짝이는 광명’의 뜻이고, 如意는 즉 등 긁을 때에 쓰이는 등긁개인데, 불가(佛家)에서는 무형(無形)으로는 ‘모든 번뇌가 끊어진 지혜’를 말하고 유형(有形)으로는 고승(高僧)이나 대덕(大德)들이 손에 잡고있는 지물(持物)이다. 도교(道敎)가 불교(佛敎)를 습합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불교적 용어로 보인다.
130)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모든 사물(事物)들과 그 사물들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현상.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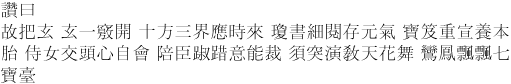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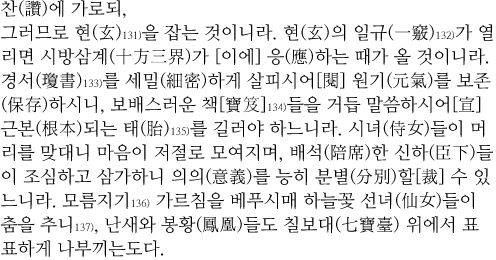 | |
|
| |
|
131) 현(玄)은 본래 ‘검다, 그윽하다, 아득하다’ 또는 ‘오묘하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의 玄은 ‘현빈(玄牝)’에서의 ‘玄’의 뜻으로 쓰였다. 현빈(玄牝)은 도(道)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서의 빈(牝)은 ‘만물을 생성하고 나타내는 기틀‘의 뜻이며, 玄은 그 빈(牝)의 작용과 변화가 ’심오하고 요묘함‘을 나타내는 말인 동시에, 현빈(玄牝)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즉, 여기에서의 玄은 현빈(玄牝)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132) 현빈(玄牝)은 선도(仙道)에서는 대체로 생사(生死)를 꿰뚫는 하나의 관문(關門)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현빈일규(玄牝一竅)라고 하는데, 이 현빈일규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석과 추론들이 있다. 그러나 청옥(靑玉)은 그저 이쪽과 저쪽, 천(天)과 지(地), 생(生)과 사(死), 성(性)과 명(命), 기(氣)와 리(理) 등 여러가지의 대비되는 것들에서 정신적, 신체적, 마음적으로 벗어나는 하나의 관문(關門)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즉 보이지 않는 구분선(區分線)이다.
133) 瓊은 붉은 빛의 아름다운 옥(玉)을 가리큰 말이다. 그러므로 瓊書는 ‘좋은 책’의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에 나온 ‘太幽碧瑤之? 攷洞微明晨之書’를 받는 말이다.
134) ?은 ‘책상자’의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비급(秘?)’과의 중의어(重意語)로 쓰인 듯 하다.
135) 本胎. 여기에서 本胎는 ‘근본이 되는 태(胎)’이외의 다른 해석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십이포태(十二胞胎)의 태(胎)를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뜻은 ‘원기(元氣)가 싹터 나올 수 있는 극히 초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이다.
136) 須突. 須는 ‘모름지기’의 뜻이다. 突은 ‘갑자기’의 뜻인데, 여기서는 난문(難文)이 된다. 문리(文理)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따로 해석하지 않았다. 공부가 얕은 청옥(靑玉)으로서는 어찌할 바가 없다. 아마도 비슷한 글자인 ‘구(究)’의 오기(誤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137) 天花舞. 위에 나온 ‘綵女仙姝 散花旋繞’를 받는 말이다.
| |
|
| |
|
| |
|
|
뇌자장(雷字章) 제일(第一) [5] l
뇌사계백장(雷師啓白章) 제삼(第三)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