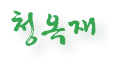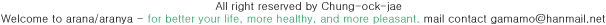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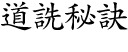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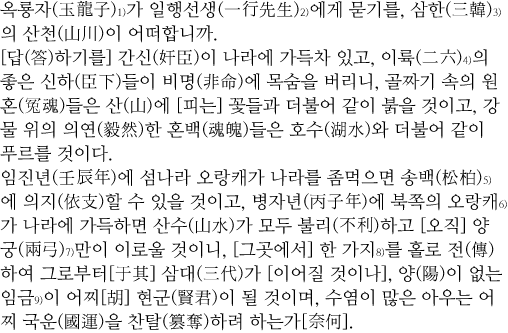 | |
|
| |
|
1) 도선(道詵)의 여러가지 아호(雅號) 가운데 하나. 도선(道詵)은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승려(僧侶). 풍수와 도참(圖讖)에 능하여 우리나라 풍수와 도참(圖讖)의 조종(祖宗)이 되었다. 도선(道詵)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비기(秘記)나 도참(圖讖)들이 전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그의 이름을 가탁(假託)한 위서(僞書)이다.
2) 일행선사(一行禪師)의 잘못이다. 선생(先生)은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尊稱)이기는 하나, 승려들을 선생(先生)이라 호칭하지는 않는다. 일행(一行)은 당(唐)의 승려(僧侶)로써, 밀교(密敎)의 영향을 받이 많았는데, 천문(天文)과 역법(曆法)에도 밝아 당현종(唐玄宗)의 명으로 대연력(大衍曆)을 완성하였다. 일설(一說)에 도선(道詵)이 일행(一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속설(俗說)일 뿐이고, 실제로는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었므로 불가능한 일이다.
3) 구한(九韓) 가운데에서 남쪽에 자리잡은 세 한국(韓國)을 말한다. 즉 변한(弁韓), 진한(辰韓), 마한(馬韓)을 아울러 가리키는 것인데, 전(轉)하여 삼한(三韓)의 지경(地境)에 세워진 나라들을 일컫거나, 또는 그 강역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4) 알 수 없다.
5) 알 수 없다. 일설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명(明)의 원병(援兵)을 이끌고 도우러 왔던 명(明)의 이여송(李如松), 이여백(李如栢)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한다.
6) 坎湖. 坎은 팔괘방위에서 북방(北方)을 가리킨다. 湖는 胡로 쓰는 것이 맞을 것이다.
7) 弓弓. 양궁(兩弓)을 말하는 것이다. 즉 두 개의 궁(弓) 자(字)를 말한다. 궁궁(弓弓)에 대하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구구한 해석이 있는데,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는 그럴 듯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격암유록에 근거하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격암유록 자체가 정본(正本)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조선중기 영조 24년에 청주(淸州)에서 괘서사건의 주모자로 몰렸던 이지서(李之曙)가 국문(鞠問)에서 궁궁(弓弓)의 뜻이 활활(闊闊)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일리(一理)가 있는 듯 하다. 궁(弓)은 활의 뜻인데, 활은 화살을 쏘아내는 도구이다. 궁궁(弓弓)은 을을(乙乙)과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을(乙)은 새를 뜻한다. 그러므로 궁을(弓乙)은 활과 새를 말한다. 또한 궁궁(弓弓)은 우리말로 ‘활활’이기 때문에 넓다는 뜻의 활활(闊闊)과 연결할 수도 있다. 또 을을(乙乙)은 우리말로 ‘새새’이기 때문에 ‘좁은 틈사이’의 뜻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山)도 이롭지 않고 물도 이롭지 않다면’ 결국은 ‘궁색한 곳에 있는 넓은 곳’에 숨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弓弓은 ‘弓弓乙乙’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외진 산골짜기의 비교적 넓은 곳’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8) 一枝. 일맥(一脈)의 뜻으로 쓰인 듯 하다.
9) 無陽之主. 양기(陽氣)가 없는 임금의 뜻인데, 여기에서의 양기(陽氣)는 남자로서의 기백(氣魄)을 말하는 것이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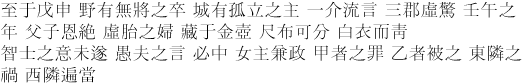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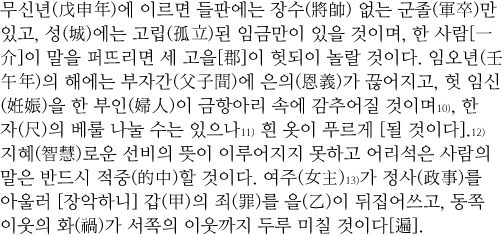 | |
|
| |
|
10) 虛胎之婦 藏于金壺. 虛胎라고 하는 것은 곧 ‘거짓말’을 말한다. 金壺는 ‘금항아리’인데, 金은 서금(西金)으로써 서쪽을 나타내고. 서쪽은 색오행(色五行)에서 흰색을 나타낸다. 흰색은 곧 백색(白色)이고, 백색(白色)은 곧 ‘아무 것도 없는 빛깔’이다.
11) 여러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으나, 사기(史記)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에 나오는 ‘一尺布’의 고사(故事)를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문은 ‘一尺布尙可縫 一斗粟尙可? 兄弟二人不能相容 (한 자의 베도 꿰매어 옷을 만들 수 있고, 한 말의 좁쌀고 방아를 찧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형제 두 사람이 사로 용납하지 않았도다)‘로써, 전한(前漢)의 효문제(孝文帝)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귀양가서 굶어죽은 이복동생 회남(淮南)의 여왕(?王)을 애석해 하면서 탄식한 말이다.
12) 父子恩絶 虛胎之婦 藏于金壺 尺布可分 白衣而靑. 이 부분은 유교적 가치관의 근간인 삼강(三綱)이 무너지는 것을 가리킨다. 삼강(三綱)이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의 세 덕목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한 자의 베를 나누려 나라를 쪼개는 것’과 ‘부자의 은의(恩義)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부인이 헛 임신을 하여 쫓겨나는 것’이 곧 그것이다.
13) 여자 임금. 여왕(女王).
| |
|
| |
|
 | |
|
| |
|
 | |
|
| |
|
14) 알 수 없다. 고려조의 동북면(東北面)과 서북면(西北面)을 일컬어 양면(兩面)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5) 난문(難文)이다. 문장구조상 ‘野’는 반드시 인칭주어(人稱主語)여야 하는데, 앞의 ‘非山非野’와는 연결하면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듯 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야인(野人)’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데, 야인(野人)은 본래 만주에 사는 여진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본문의 ‘野’가 과연 그러한 뜻으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16) 國器. 國器는 본래 ‘나라의 동량이 될 큰 인재’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國機, 즉 ‘나라의 기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17) 정(鄭)의 파자(破字)이다.
18) 임금을 말한다.
19) 三隣.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
|
| |
|
| |
|
|
비결집록(秘訣集錄) l
비결집록(秘訣集錄) |
|
| |
|
|